소낙비
참,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날씨가 한반도를 괴롭히고 있다. 장마가 끝났다고 해서 여러 날의 찜통더위를 견뎠더니 갑자기 물 폭탄이 쏟아져 남쪽 지방에서는 하천이 범람해 마을을 덮치고 다리가 끊어지고 산사태에 집들이 묻히는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기상청이 아니라 ‘구라청’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기상청의 슈퍼컴퓨터의 예보조차 지구의 변덕에 번번이 빗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근래에 들어 ‘게릴라 성(性) 호우(豪雨)’라는 말을 부쩍 자주 듣고 있다.
게릴라(guerrilla)라는 말은 나폴레옹 전쟁에서 프랑스의 대군을 맞아 스페인이 소규모의 부대로 기습적인 공격을 가한 전술을 이르는 스페인 말에서 왔다. 전쟁을 의미하는 ‘guerra’와 작다를 뜻하는 ‘illa’가 합해져 우리말로는 유격전(遊擊戰)쯤으로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언제 어디서 적이 기습해올지 몰라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폭우도 그랬다. 갑자기 300mm의 폭우가 쏟아진 곳도 있다고 한다. 피해지역의 복구가 빨리 이루어지고 재난을 당한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늘 하늘을 쳐다보며 살아야 하는 농경민족이었던 탓일까, 우리말에는 내리는 비의 모양새나 소리, 혹은 강수량에 따라 각각 달리 부르는 이름들이 유달리 많다. 오는 듯 마는 듯 시야를 흐릿하게 하는 안개비, 이른 아침 학교길의 빨간 우산, 노란 우산, 찢어진 우산 위로 내리는 이슬비도 있고 은근슬쩍 내려도 옷 젖는다는 가랑비도 있다. 보는 이의 심사에 따라 보슬비가 부슬비가 되기도 하고 소나기가 소낙비가 되기도 한다. 억수라는 말은 ‘억쑤로’ 할 때의 경상도 방언이 아니라 하늘에서 바켓으로 들이붓듯 앞이 안 보이게 쏟아지는 비를 일컫는 우리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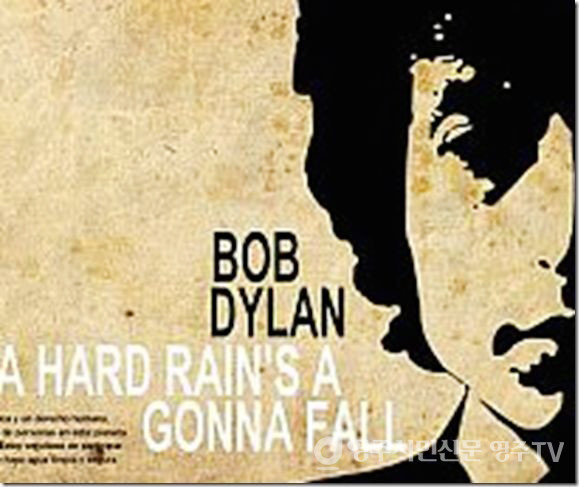
<정선 아라리>의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장마 질라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다 몰려든다’라는 대목은 비가 쏟아져 앞 도랑물이 불으면 건넛마을 총각을 못 만날까 근심하는 아오라지 처녀의 애끓는 넋두리다. 그 반대의 심사도 있다. ‘ 바람 불으소서 비올 바람 불으소서/ 가랑비 그치고 굵은 비 들으소서/ 한길이 바다 되어 님 못 가게 하소서’ 작자미상의 이 조선시대 시조에는 한바탕 쏟아지는 비로 이별의 시간을 늦추려는 여인의 간절함이 담겨 있다.
비가 때로는 대기 중의 수증기가 높은 곳에서 찬 공기를 만나 엉기어 떨어져 내리는 물방울이 아니라 눈물이 되기도 한다. ‘두 눈에 맺혀 있는 이 눈물은 아마도 빗물이겠지’ 우리 옛 유행가 이상열의 <아마도 빗물이겠지>의 한 대목이다.
에벌리 브라더스의 노래 <빗속을 울며(Crying In the Rain)>에서는 이별의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비를 기다린다. 왜? 그래야 ‘당신이 내 눈물을 빗물인 줄 알 테니까(You won’t know the rain from the tears in my eyes)’ 올리비아 뉴튼 존은 <Blue Eyes Crying In the Rain>에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빗속에서 울고 있던 당신의 푸른 눈동자를 잊지 못할 거라고(Through ages I remember/ Blue eyes crying in the rain) 말한다.
그리고, 빗소리와 천둥소리로 시작되는 <Suspiranno>에서 이탈리아 가수 까르멜로 자폴라는 노래한다. 지금 어딘가에서 당신이 밟으며 걸어가고 있을 빗물이 내 눈물이란 걸 당신은 모를 거라고.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영주(Once upon a time in Yeongju), 옛날에 영주에 문화예술 애호가들이 주로 드나들던 ‘문’이라는 카페가 있었다. 뮤지션이었던 그 집 주인은 비 오는 날 들를 때면 작은 무대로 나를 초대해 기타를 안기며 <소낙비>라는 노래를 청하곤 했다.
‘무엇을 보았니, 내 아들아 무엇을 보았니, 내 딸들아/ 나는 늑대의 귀여운 새끼들을 보았소/ 하얀 사다리가 물에 뜬 걸 보았소/ 빈 물레를 잣고 있는 요술쟁일 보았소/ 소낙비 끝없이 비가 내리네’ 쉰 목소리로 근사한 가사의 그 노래를 불렀지만,
사실 뮤지션으로서는 전무후무하게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밥 딜런의 원곡 노랫말은 좀 끔찍했다. 피로 얼룩진 검은 강과 총칼을 든 아이들과 핏물이 떨어지는 망치가 등장하기도 하는 반전(反戰) 노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노래에는 우리 삶의 무정처(無定處)가 빗소리처럼 녹아 있기도 했다. 그 카페는 오래전에 사라지고 그 집 주인도 이제 세상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