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화봉-화전촌-비로봉-국망봉-석륜암-초암사

연화봉-비로봉 주변 화전촌 사람들은 원시 그대로의 생활
명성황후가 백여칸 큰집을 세웠다는 민백이재와 대궐터
석륜암-초암사 계곡은 세상 밖 베풀어진 신비의 별유천지
『송지향의 소백산탐승기』 1~3회가 연재되는 동안 선생의 지인과 후학들이 선생을 기리는 글을 보내왔다.
그중 또 한 사람이 선생의 제자 김인순(풍기 금계) 향토사연구가다. 김 연구가는 『풍기초등학교 100년사』·『일제강점기의 영주』 등 10여 권의 향토사 관련 책을 펴냈고, 『신 풍기지』 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김 연구가는 “선생께서 소백산의 자태를 워낙 특유한 문장으로 표현하셔서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산정무한(山情無限,정비석)’에 버금가는 글이 아닐지 감히 우러러 본다”면서 “제가 향토사 언저리에서 20여 년간 살아온 것은 유계 선생 덕분”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송지향 선생은 비록 고인이 되셨지만 언젠가는 ‘영주선비대상’ 수상자가 될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공적서를 작성하여 지역사회와 공론하고 있다”면서 “선생은 우리 향토사에 기여한 거물(巨物)이셨으며 역사, 유학, 한의학, 국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넘치게 가지셨던 참 선비이셨다”고 했다.

연화봉 지나 화전촌
「연화봉 비탈을 돌아 한 오리를 내려가면 다시 울창한 밀림이 나선다. 몃 억만년 두고 부월(斧鉞)이 들어보지 안흔 처녀림인 밀림지대다.
낙엽송이며 젓나무 잣나무들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참천페일(參天蔽日)하여 몃발 앞도 바라볼 수 업슬만하고 구십도를 넘는 염천임에도 불구하고 음산한 기운이 뼈속까지 슴여들여 그 숙연한 정상은 비할데 업다.
가도가도 끄치업슬듯하던 밀림도 골을 건너고 등성이를 넘고- 다시 굴엉이를 건너고 등성이를 넘기를 몃번이고 되풀이하고 나니 밀림이 다하는곳에 조그나한 화전민 부락이 나타난다.
시끄러운 속세와 노피담을 싸코 태고의 유한과 정적을 그대로 누리고 잇는 이 화전촌은 이세상이 시작된때부터 온갓 고요함, 온갓 깨끗함을 속뽑아서 싸움의 세상박게 따로 건설한 평화의 동산인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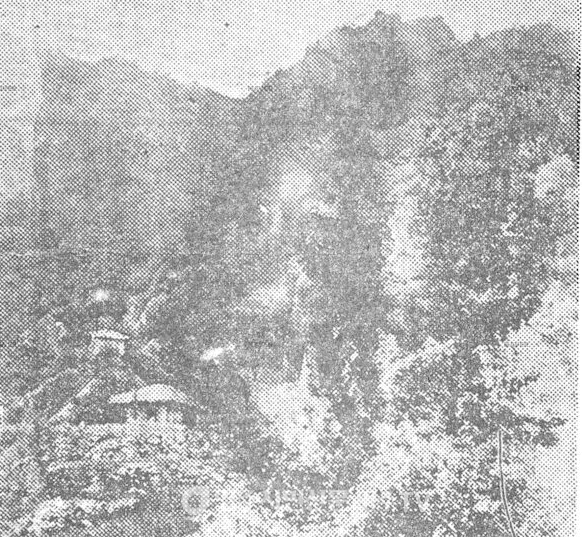
이비탈 저언덕에 한집씩 두집씩 띄엄띄엄 잇는 주민의 초막, 밧치라야 산비탈에 밀림을 찍어 넘기고 불을 질러서 개간한 것들인데 바위틈 잿빗 흙우에 심근마령서와 옥수수 등이 될성부른 싹이 무성히 자란다.
돌무더기 틈에서 어떠케 저럿틋 잘될까- 수건동인 남정네들과 치마귀를 거더 허리에 질흔 안악네들이 화평한 얼골로 무슨 이야기를 자미롭게 주고 바드면서 부지런히 김을 맨다.
밧엽 그늘진 바위ㅅ돌에는 어머니를 따러온 벌거숭이 애들이 들꼬츨 뜨더서 소꿉질을 한다. 그 그늘아래 풀밧테 매인 누렁송아지는 한가로히 누어서 색임질을 한다. 우리눈에 비치는 모든 광경이 한껏 한가로웁고 한껏 평화로우며 성스러워보인다.」

귀틀집과 너와지붕
「어느새 해가 서편으로 기울어 우리는 길엽헤 초가집을 차자 들엇드니 젓먹이를 등에 업은 안악노인이 주름잡힌 얼굴에 가득 우슴을 지으며 십년지귀나 되는냥 반가이 마저준다. 뚝여페 짐을 벗고 방안에 들어서니 내적은 키로도 서지못하리만큼 천반이 낫다.
집은 나무를 찍어다가 껍질도 벗기지 안코 도끼로 끈허서 우물정짜 모양으로 올려싸코 새의 틈구녁만을 흙으로 막엇고 지붕은 아름두리 나무를 베어다 넓슥넓슥하게 장작을 패어 비늘을 달아 덥헛스며 방안 천반도 장작감이를 그대로 얼거노앗스며 흙한조각 바르지 안헛고 방바닥 자리는 무슨 나무껍질인듯한 걸로 결어서 깔앗다.
물질문병이 절정에 달햇다는 오늘이지만 그 혜택을 조금도 밧지않고 이곳 주민들은 원시 그대로의 생활을 영위하고 잇다.

감자를 드믄드문 석근 옥수수밥
「감자를 드믄드문 석근 옥수수밥에 소금으로 끄린 산나물국 점심을 맛나게 먹고 난 우리는 주인 할머니께 사례들인 다음 길을 물러 가지고 바쁘게 나섯다.
한 십리가량이나 계곡을 따라 내려가니 양안에 벼랑이 드리는데 이 골짜기를 내려가노라면 차츰 골이 좁아저 내려가다가 좌우 단애가 똑가튼 형상으로 중간을 향하고 오그러들어서 골문(谷門)을 일워 노코는 산맥은 급작스레 끄허저 깍근듯한 벽은 만길지하로 내려드리웠던 건너편도 역시 가튼 벼랑으로되어 발아래에는 가물가물하게 만길 굴엉인데 단애와 단애 사이를 걸처 아름두리 단목을 연폭하여 다리를 노헛다.
이 단목교(檀木橋)는 인근에서 매우 신성시하여 주민에게 지대한 숭앙을 밧는다는데 칠팔십난 노인들까지도 그다리 노흔 연대를 알지못하리만큼 오래지만은 아직까지도 나무가 생생한대로 잇는 것은 퍽신기한 수수꺽이다.
소백산 후면에 삼십육곡이 독가튼 단애곡문(斷崖谷門)이라고 하는데 다리가 노히기는 이곡문으로서 소백입산의 유일한문이다. 태초에 창조주께서 소백산을 지으실때에 이특별히 이룩하신 성지영역을 신성히 보존하기위하여 오직 한문을 두엇슴인듯하다. 금물을 녹여부은듯한 낙조가 산곡을 물드릴즈음 다리를 건너 한촌가를 차저들어 행장을 끌르고 하로동안의 피로를 쉬엇다.」 1940.7.9. 화
단목교-민백령-대궐터
다음날(1040년 6월 22일) 「오늘도 역시 일기는 명랑하여 몸과 마음이 날어갈 듯 거뿐한 기분으로 햇살도 채 퍼지기전에 이츰 이슬맷즌 풀길을 헤매며 어제 건너온 단목교를 다시 건너 양안의 석벽이 하늘에 다은 곡문을 지나올라서 왼편으로 시내를 건너서부터는 다시 하늘을 가리우는 천고의 처녀림 속으로 비로봉을 향하여 오르게 되엇다. 여기도 역시 끗업는 밀림지대다. 워낙 무성한 밀림 속이라 잡초도 그리 성하지 못햇다.
간혹 일흠모를 꼿들이 하늘 뒤덥흔 그늘 속에서 제법 빗잇게 피어서 하늘춤을 춘다. 아무도 보아주는이업는 외진 산골에 누구를 위하여 이러케 피엇나? 남이야 보건안보건 오직 자기의 천분만을 다하는 고산지대의 꼿들이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우리네 인간에 무언의 경게를 던지는 듯하여 꼿조차 영경(靈境)의 것이라 사람의 눈만을 즐겁게 하기위하여 피는 화단 우의 꼿보다는 훨신더 갑잇어 보이고 성스러워 보인다.
가지각색의 호접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안코 어깨를 손등으로 턱업시도 겁업시 내려안는다. 밀림 속으로 길도 업는 비탈을 오르고 또 오르니 하늘이 안보이도록 꽉 들어섯던 숲이 약간 성글어지며 소백산의 최고봉인 비로봉 정상이 올려다보이고 비로봉 북맥을 타고 넘은 민백령(閔百嶺)의 등넝쿨 더핀 삼림속 샛길이 나타난다.
이샛길을 조차 한 언덕을 올라서니 한 일정가량 되엄즉한 사방으로 석축을 둘러싸흔 평탄한 풀밧이 잇는데 욱어진 풀숩 속에 깨어진 기왓장이 발끗에 채인다. 바로 이뒤 고개가 민백령인데 고개 일흠이 민씨(閔氏) 백명이 피할곳이라 하여 오륙십년전 명성황후가 백여간이나 되는 큰집을 세웠던 것이라는데 이십여년전에 화재로 타버리고 말엇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곳을 이름하여 대궐터라고 일러온다.」
국망봉-석륜암-초암사
해발 일천칠백여메터의 비로봉 우에 오르니 키를 잴듯한 ‘새강’바더요. 듬성하게 몃백년이나 모진 풍상에 찌드른 듯한 교목(喬木)이 서잇는데 한 특이한 가관은 교목이 밋둥은 아름이 넘지만은 키는 그중 노픈놈이라야 한길이 남즉한데 꼭대기에만 가지가 꽉벌어저서 마치 그 형상이 우산을 펴들은듯하다.
이윽고 눈을 들어 둘러보니 하게의 대소 여러산은 눈아래 내려다보인다. 북편 산기슭에 바로비낀 세봉은 그림자가 매주 운치잇게 보인다.
허리굽은 교목이 엉성드뭇한 비로봉 북맥을 타고 국망봉을 향해 길인듯도 하고 아닌듯도한 풀숩을 헤처 무수한 기암괴석을 안고도니 국망봉 조금 못미더 숭섬한 장경인 석륜(石崙)이 나타난다.
석륜은 국망봉 정상밋 남을 향하고 반월형으로 둘러싸인곳인데 좌우와 후면 세곳은 층암절벽으로 병풍을 두르고 움우러진 구석바위등에 매우 청결한 삼간 초막(草幕)이 서잇는데 처마에 석륜암(石崙菴)이라 가로색인 날근현판이 부첫다.
기지도 지추도 천연의 반석을 그대로 이용한 것과 암자뒤 석벽에 붙어선 몃그루의 노송이 압을 향하여 버더서 집을 더픈 것이 한 가관을 이루었다.
바로엽 좌편에 깍어 꼬즌 백여장의 돌봉이 올연히 서잇는 아래에 바위미트로부터 한줄기 새암이 솟아 흐르는데 머리를 새파라케 깍은 백발노장이 저녁쌀을 싯는것도 이곳아니면 볼수업는 한시경이다. 국망봉 허리에 걸친 석양이 석륜기승(石崙奇勝) 아름다운 락조로 한층 경개를 장식하엿다.
우리는 석양을 등에지고 초암을 향하여 미끌어지듯 울창한 밀림더핀 비탈을 내려와 으슥한 계곡으로 빠지니 양안에 드리운 절벽과 흰옥가튼 바위새를 스처흘으는 구슬가튼 냇물이며 숩사이로 솜뭉치가튼 백운이 한가이 오고가는 것과 간간이 들리는 새울음은 세상박게 베풀어진 신비의 별유천지(別有天地)이라 무어라 표현할수 업슴을 새삼느끼지 안흘 수 업다.
페절의 비운에 직면되었던 초암사는 김상호(金祥鎬)씨의 분기로 관민 유지의 성원을 어더서 금년 봄 신축했다」
後記:초암사에서 부석사를 거쳐 문성공 안유 선생의 소수서원을 돌아온 것은 여기에서 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