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다 꿈이 더 많았던 서울가는 길, 중앙선은 희망을 실어가는 꿈의 통로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 - 헬렌 켈러
중앙선 새 철로는 영주역과 풍기역 주변과 시가지는 그 자리이지만, 다른 곳은 많이 변경되었다.
귀내에서 창진으로 휘청 꺾어져 일원, 안심 마을 앞을 지나 풍기로 향하던 철길은 창진동 마을 뒷산을 뚫고, 고바우마을로 나와, 안심과 오계의 중간쯤인 전지골을 지나, 옹암리와 산법리 앞을 지나 풍기역으로 간다.
풍기역에서도 백리 입구에서 백신리 앞을 지나 희방사로 가던 철길이 창락에서 땅 속으로 들어간다. 산 아래를 지나던 길이 들판 한가운데로 지난다.


우리 삶을 끌어왔던 중앙선
중앙선 열차가 지나는 시간은 늘 그 시간이었다. 그래서 오후 하행선 기차가 지나가면 어머니는 저녁을 준비하셨고, 우리는 쇠풀을 뜯기려고 산비탈에 매어 둔 소를 거두러 갔다. 그리고 철길 멀리서 기차를 향해 손을 흔들곤 했다.
서울로 가는 기차는 부러움이었고, 내려오는 기차는 기다림이었다. 서울은 가고 싶은 첫 번째 장소였고, 또 선물을 안고 내려올 누군가가 있을지 모를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기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다가 우린 다시 죽령을 바라보곤 했다.
죽령을 보면 바람소리부터 들렸다. 백두대간 사이 잘록한 그곳을 넘어 불어오는 바람은 한겨울엔 살갗을 도려내듯 세찼지만, 봄·여름·가을·겨울, 그 바람이 불어오는 고개 너머를 그리워하며 살았다. 거기엔 다른 삶을 열어주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죽령을 ‘아흔아홉 굽이에 내리막 30리 오르막 30리’라고 했다. 이 고갯길은 1933년 신작로가 열리고서도 사람들은 늘 다녔다. 하지만 1941년 그 밑으로 죽령터널(4.5Km)을 뚫어 중앙선 철도를 이으면서 옛길이 되었다.
또 2001년에 중앙고속도로가 새로 터널(4.6Km)을 뚫고 개통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곳은 죽령은 옛길, 신작로, 철길, 고속도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길의 백화점이 되어버렸다.


거침없이 직선인 새 철길
지난 1월 5일, 80년 만에 새길로 첫 운행에 들어간 기차는 거의 하늘 위로 달렸다. 직선으로 난 길을 따라 달리며, 산을 만나면 그냥 굴을 뚫어버리고, 길을 만나면 고가다리를 놓았다. 건널목도 없었다.
희방사역 쯤에서 새로 만든 죽령터널을 찾아보려고 했다. ‘여기쯤일까?’하며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지만 찾을 수 없다. 다시 창락으로 내려와 풍기로 향한다. 철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풍기역 쪽에서 오던 기차가 창락도 가기 전에 사라져버린다. 거기서 벌써 굴이 시작되는 모양이다. 새 죽령터널의 길이는 11,16km라고 한다.
신 중앙선의 38개의 터널 중에서 여기보다 더 긴 곳이 백운터널(14.24km), 박달터널(11.24km)이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은 50.25km인 율현터널이다.


한때 전국에서 제일 길었다는 옛 죽령터널도 4.5km였다. 그때 우리는 이것이 전국 제일이라고 자랑을 했었다. 이곳을 지날 때, 흰 와이셔츠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었고, 이 터널을 지나며 눈을 감았다가 그만 잠이 들었노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졌다.
“죽령터널 열차사고 속보
희생자 48명으로 판명
중경상자는 방금 구호중”
1949년 8월 21일 조선일보 보도였다. 사고원인은 객차 6량으로 편성된 서울발 열차가 8월18일 오후 5시 55분 죽령을 사고가 났다는 기사이다. 그리고 19일 오후 2시에 선로를 완전 복구했다는 내용도 전하고 있다.


보급열차와 특급열차
하지만 이 중앙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였다. 완행은 완행대로 급행은 급행대로 열차는 항상 만원이었다. 완행은 모든 역은 물론이고, 역사(驛舍)도 없는 간이역에도 섰다. 버스마저 귀했던 시절 완행열차는 중요한 발이 되어주었다.
완행열차의 가장 큰 혜택은 통학하는 학생들이었다. 아침저녁에 운행했던 통근열차는 봉화에서 풍기에서 장수에서 문수에서 오는 열차에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빼곡했다. 그 학생들은 열차가 닿기도 전에 뛰어내렸다는 자랑을 많이 했다. 역까지 가면 학교가 그만큼 멀어지기 때문이까?
서울까지 하루 낮이 꼬박 걸리는 시간은 급행열차를 만들게 된다. 자리가 보장된 급행은 ‘특급열차’이었고, 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급행은 ‘보급열차’이었다. 보급열차는 주로 밤차였다. 두 사람이 앉는 자리에 세 사람이 앉는 것은 예사였고, 신문지나 가방을 깔고 앉아가는 모습은 허다했다.
밤차를 많이 이용하는 것은 장사꾼들도 많았지만, 휴가 장병들의 모습도 잘 볼 수 있었는데, 술에 취한 군인들도 많았다. 술은 밤차만이 가질 수 있는 낭만이었었다.



교역도시의 영화

1955년 영암선(영주-철암)이 개통되면서 중앙선은 더 바빠진다. 철암에서 나오는 석탄을 전국에 실아 날라야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63년 강릉까지 영동선이, 1966년 김천까지 경북선이 개통되면서 영주는 교역도시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강릉이나 동해안으로 가는 사람들은 영주에 와서 영동선 기차를 갈아탄다. 설악산에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도 영주를 거쳤다. 그 당시 영주역은 불야성(不夜城)이었다.
1970년쯤 통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젊은이들을 달리는 기차 안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연필을 팔러 다니는 학생들의 모습도 열차 안에서 종종 볼 수 있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장사를 하는 학생들이었다.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열차 안의 모습은 1970년대의 모습이었다.
영주의 역할은 차츰 시들어갔다. 영주역이 신영주로 이전하는 1973년 태백선(제천-백산역)이 뚫려, 이제 강릉을 가기 위해 서울서 오는 사람들은 영주까지 오지 않고 제천에서 갈아탔기 때문이다. 그후 느린 기차는 마음 바쁜 사람들을 버스로 향하게 하였다.
올해 중앙고속철도가 개통을 하였다. 그런데 멀지 않아 서산에서 울진까지의 ‘동서고속철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영주 사람들은 기대를 한다. ‘과거의 영화가 다시 찾아올까?’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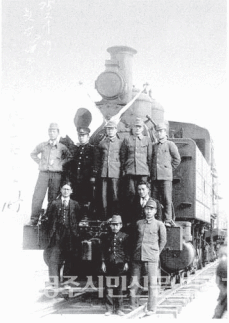
사연을 싫어 나르던 기찻길
1965년 영주역에서 영화 촬영이 있었다. ‘삭발의 모정’이란 영화였다. 왜 영주역에서 촬영을 했을까? 영주역은 오가는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날품팔이를 하는 이들에겐 좋은 일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일상의 모습을 찍기 위해서인 듯 했다.
그날 서울서 내려온 배우들을 보기 위해 영화를 찍는 사람보다 그것을 구경 온 사람들이 더 많은 진풍경을 보여주기도 했다. “머나먼 전선에서 아들이 왔건만 밥 한 끼 못 먹이는…머리에 수건 쓰고 감추려 했지만…” 은방울 자매가 부른 ‘삭발의 모정’ 가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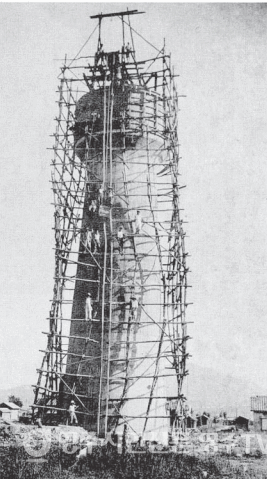
요즘 트롯이 유행이지만, 그 때는 사연마다 영화를 만들고, 노래를 만드는 것이 유행이었다. 1940년대에 징병, 징용, 근로정신대 등 일제가 만든 전선으로 끌려가던 젊은이가 많았다면 해방 이후엔 돈을 벌기 위해 고향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그 당시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나 ‘불효자는 웁니다.’ 류의 노래가 많았다.
그리고 수첩에 이런 글귀를 많이 적어 놓기도 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어려운 현실을 알았기에 두 손을 꼭 쥐고 살았던 희망이 많던 시기였다. 특히 서울로 가는 이 중앙선 열차는 부푼 기대로 꽉 차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