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庭園, garden)은 우리 고유의 뜰을 일컫는 단어이다. 우리의 「정원문화」는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무려 2,000년을 넘어서는 유구한 역사다. 고구려 동명성왕 6년 ‘신령스러운 공작이 궁정(宮庭)에 모여들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온다.
특히, 유리왕 때는 궁궐의 정원 관리사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백제는 부여에 궁남지(宮南池)라 부르는 연못을 판 기록이 있다. 신라는 경주 안압지(雁鴨池)에서 더욱 확실해진다. 또, 포석정(鮑石亭)은 중국에서 전래된 유상곡지연(流觴曲之宴) 정원으로 극치에 달한다. 이들 정원이 일반 민가로 전파되면서 웬만한 가옥도 「정원문화」 가꾸기에 다투어 나서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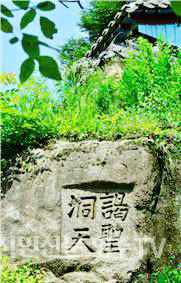
정원은 음양오행설이나 풍수지리설에 근거하여 터를 잡을 정도로 신중했다. 집 뒤 언덕에 단을 쌓고 돌을 놓아 모란, 매화를 심는다. 뜰 안 동쪽으로 자두나무, 북쪽은 살구나무, 남쪽에 매실나무, 뜰 앞에는 석류나무를 심는다는 개괄적인 원칙이 있었다. 특히, 연당(蓮塘, 연못)은 우리 정원의 하이라이트 요소였다. 연못을 팔 수 없는 곳에는 산정(山亭)을 짓고 연못 대신 돌로 화분을 만들어 연꽃을 키운다.
또, 시냇가에는 계정(溪亭)을 짓고 흐르는 계류를 연못 대신으로 즐겼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자연스럽게 활용한다는 뜻이다. 상록수나 잔디는 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움트고, 잎 나고, 단풍 드는 활엽수를 주로 심어 자연을 살피고,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의 법칙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정원의 구성 원리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정원은 일찍부터 도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자연과 신비가 강조되고, 사람을 항상 자연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집 주위의 자연과는 늘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즉, 집이나 정원 등을 자연의 일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과 함께할 때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건강해진다. 그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것이 정원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이다.
공원(公園, park)은 시민들의 휴식, 여가 등을 위한 공공장소로, 대개는 놀이를 즐기는 공간을 말한다. 서양으로부터 전래한 「공공놀이터」인 셈이다. 우리나라에 공원이 들어온 것은, 조선 말기(1897) 원각사 자리에 영국인이 설계한 「파고다 공원」이 처음이란다. 그러니 약 130년가량이다. 그리고 많은 공원은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만들어진다. 특히, 출입이 금기시되던 사직단(社稷壇, 농신제단)이나 성곽(문화재) 등을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미명(美名)으로 거침없이 개방하였다.
문화와 문화재가 급격히 훼손됨은 물론이다. 한양 사직공원, 부산 용두산공원, 대구 달성공원, 광주 사직공원 등이 그 예이다. 나아가 일제는 그 문화재 구역에다 신사(神社)를 세우기까지 하여 우리 문화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당시 성곽이었던 영주의 구성공원, 사직단이었던 풍기의 공원산 등이 개방된 시기도 이 무렵이다. 이후 1970년대 산업화 바람에 휴식공간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무분별하게 오락 시설이 추가된 공원들이 난립하여 개방되는 바람에 어떤 곳은 우범지대로까지 전락 되었다. 너무나 자유스러운 24시간 개방 때문이었다.
서양의 공원들은 저녁이 되면 문을 닫는다. UN 및 유네스코의 권고사항이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공원을 개방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한다. 한국이 UN의 권고를 무시하는 셈이다.하여간 지금은 ‘공원’ 파워에 밀려, 2,000년이 넘는 우리 전통의 ‘정원문화’가 사라져 가는 꼴이랄까?
급기야, 정부는 <순천만국가정원>, <태화강국가정원> 등 국가사업에 ‘정원’이라는 글자를 넣었다. 지금 영주가 준비 중인 <번계들국가백년정원> 도 우리의 ‘정원’ 격조를 갖춘 수준 높은 「선비 정원」이 탄생 되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