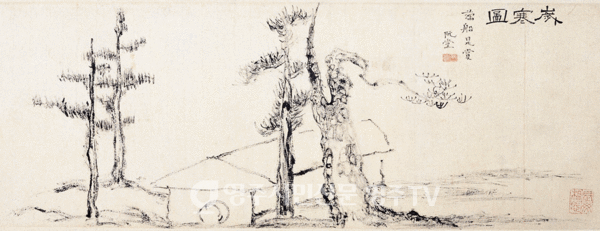
추사의 세한도(歲寒圖, 국보 제180호)는 흔히 ‘무가지보(無價之寶,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보물)’라고 한다. 이를 한 미술품 소장가가 조건 없이 국가에 기증하여 온 나라를 달구었던 것이 얼마 전이다.
단순하기 그지없는 세한도에는 그림 자체보다도 추사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과정과 그 감정이 가장 잘 나타나 있어 문인화의 정수로 평가된다.
그러함에도 사람들은 정작 문인화의 핵심이라는 사의(寫意, 그리게 된 배경) 즉, 그림 속 이야기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였다. 특히, 그림의 시발점이 소수서원 학자수 소나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무척 드물었다.
추사의 세한도는 자신의 내면세계에 집중한 문인화이다. 그리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가격만큼 제자 이상적의 감동적인 예화 등 수많은 이야기가 바닥에 빼곡하게 깔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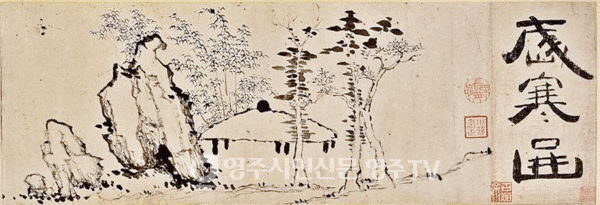
조선 후기 철종 때 영의정이었던 권돈인(權敦仁)이 순흥 땅 동촌(조개섬)에서 9년간 유배 살이 할 때, 소수서원을 오가며 늘 마주치던 학자수(學者樹)를 주제로 세한도를 그렸다. 그리고 이를 제주에 유배 중인 절친 추사에게 보내 발문을 받는다. 이때 추사는 권돈인의 학자수 그림에서 얻은 영감으로 자기만의 세한도를 그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그려진 세한도가 자신의 애제자 이상적에게 고마움을 담은 선물로 주어지고, 이상적은 다시 그의 제자 김병선에게 물려주었다.
김병선은 아들 김준학에게 상속하고, 김준학은 한말 세도가 민영휘에게, 민영휘는 아들 민규식에게, 민규식은 일제강점기 추사 연구가이던 후지쓰카 지카시(藤塚鄰)에게 넘겨 1940년 급기야 일본으로 넘어가고 만다.
이 소식을 들은 서예가 손재형(孫在馨)이 1944년 미군의 공습을 뚫고 현해탄을 건너가 몇 달 동안을 석고대죄(席藁待罪) 하다시피 애걸한 끝에 ‘세한도’를 도로 찾게 된다는 이야기가 추가되어 있다.
이후에도 여러 곡절을 더 겪은 ‘세한도’가 수장가 손세기의 소장품으로 안착한 뒤, 작년 들어 아들 손창근(92세) 옹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여 국가의 소장이 된 것이다.
세한도를 도로 찾기 위해 손재형이 돈 가방을 채워 일본으로 건너가 후지즈카 지카시 앞에 무릎을 꿇고 몇 달 동안을 사정했더니, 꿈쩍하지 않던 후지즈카가 “이 작품을 그토록 사랑한다니 그냥 가져가라”고 했다는 대단한 이야기가 한 번 더 추가되면서 세한도의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고 한다.
손재형이 세한도를 양도받고 난 뒤 3개월 만에, 도쿄 대공습으로 후지츠카의 서재가 모조리 불타면서 그가 수집했던 추사의 수많은 작품도 함께 사라졌다고 하니, ‘세한도’야말로 이런 극적 드라마틱까지 보태지면서 그 가치가 극대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