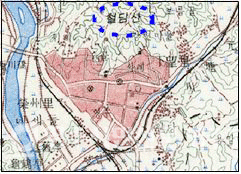
출가 이후 참으로 오랜만에 고향을 들렀다는 늙그수레한 여인네가 <철탄산>이라고 쓴 간판 앞에서 연신 고개를 기울인다. 뭔가 통 알 수 없다는 표정이다.
“나는 철/담/산으로 알고 있는데… 담처럼 둘러싸여서… 영광중학교 교가에도 나오고…”
영광중학교 앨범을 뒤지면 <태백산과 철담산의 기상을 타고…>로 시작되는 교가가 실려 있다.
담으로 둘러싸여서 철담산이 된 건 아니겠지만, 지금 <철탄산>으로 부르는 산은 예전에는 분명 「철담산」이었다. 어느 날부터 <철탄산>으로 쓰더니 이제는 아예 굳어진 듯하다. 그러나 연로하신 어르신네는 아직도 「철/담/산」이다.
지명에는 몇몇 특별한 사례가 있다. ‘木瓜’라는 과일을 ‘모과’로 읽는 것처럼, ‘牡丹’꽃을 ‘모란’으로, ‘臥丹面’ 지명도 ‘와란면’으로 읽는다. 이런 사례는 천지삐까리다.
크게 아름을 안는다는 한+안음이 ‘한 아름’이 된 것처럼, 아버지의 아버지인 한(大)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었다. 이런 현상들을 활음조(滑音調) 현상이라고 한단다. 발음을 매끄럽게 하는 청각적 효과를 주는 작용이다.
속이산(俗離山)이 속리산으로, 지이산(智異山)이 지리산으로, 한나산(漢拏山)이 한라산으로, 마니산(摩尼山)이라고 쓰고 마리산으로 읽듯, 철탄산(鐵呑山)도 「철담산」이래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억지로 거칠게 <철탄산>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고래로 작명원칙에는 거친 발음을 금기로 삼는다. 거친 이름을 가진 아이가 성격이 거칠다고 한다. 격음의 강아지 이름이 강아지를 사납게 만든다는 말이다. 지명에는 사주팔자도 들어있다고 한다. 해서 격한 발음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이다.
출향 카페를 들여다보면 <철담산>에 대한 감회가 심심찮게 올라 있다.
<나도 철담산 정기를 받고 자랐다. 태어나기도 철담산 줄기에서 태어났고/ 내 1살 때 기억..ㅋ- 철담산 아래에서 살았던 것 같다. 젖먹이 때^^/ 지금쯤 철담산에는 아카시아 꽃향기가 만발하겠지…/ 철담산 밑을 자전거 드라이브(?)하던 기억이 난다.^^/ 어느 분의 고증으로 철탄산으로 되었다지만, 우리 분명한 건 철담산이었어…/ 내는 철담산으로 알고 있데이…/ 나도 어릴 적에 ‘철담산’ 이렇게 불렀었지/ 철담산의 정기를 받은 아이들 어디 있냐?>
이런 예는 출향 시인의 작품에도 자주 등장한다.
영주의 찬가 /시인 김화묵
<상략>
철담산 철쭉꽃 그윽한 향기 피어나/ 동네마다 은행나무 번영을 약속하며/ 까치 소리 집집마다 밝은 미래 노래하는/ 인심 좋고 아름다운 영주에서 살아가리라.
자궁/시인 송정란
철담산 아랫자락/ 계곡을 타고/ 달빛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략>
농고 오하근 선생의 가사 <철담산 화전놀이>에도 ‘철담산’이 다섯 번이나 반복된다.
국토지리정보원 발간 책자에는 <산의 형세가 남쪽을 향해 달려 ‘철탄산’이라고 했다는데, 이는 잘못된 설명이며, ‘높은+땅+산’이란 뜻의 [소이딴뫼(쇠딴뫼)]→[솔+단+뫼]를 한자로 옮길 때 ‘鐵呑山’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다. 원래대로라면 [솔단산]이 되어야 한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