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간(幢竿)은 삼국시대 불교가 전파되면서 사찰 앞에 돌이나 쇠로 만들어 높이 세운 조형물 기둥을 말하는 것으로 찰간(刹竿)이라고도 한다.
찰간에는 종파를 알리는 깃발을 달았는데, 행사를 공지하고, 그 일대가 사찰이라는 신성한 영역임을 알리는 동시에, 사원의 모든 액운을 물리친다는 의미로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 워낙 크게 설계된 당(幢, 깃발)은 늘 달아두기가 어려워 어떤 기도나 법회가 있을 때만 특별하게 다는 것이 보통이다.
당간(깃발을 다는 장대)은 보통 나무나 철로 만들어 오래 버티지 못하므로 현재까지 남은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당간을 세웠던 지주(支柱, 버팀대)는 대부분 돌로 다듬어진 석조물이므로 지금까지 다수 남게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남은 석조 당간지주는 모두 통일신라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면 틀림없다. 우리 지방에는 「숙수사지당간지주」(보물 제59호) 외에도 부석사당간지주(보물 제255호)와 삼가동석조당간지주(지방유형문화재 제7호-비로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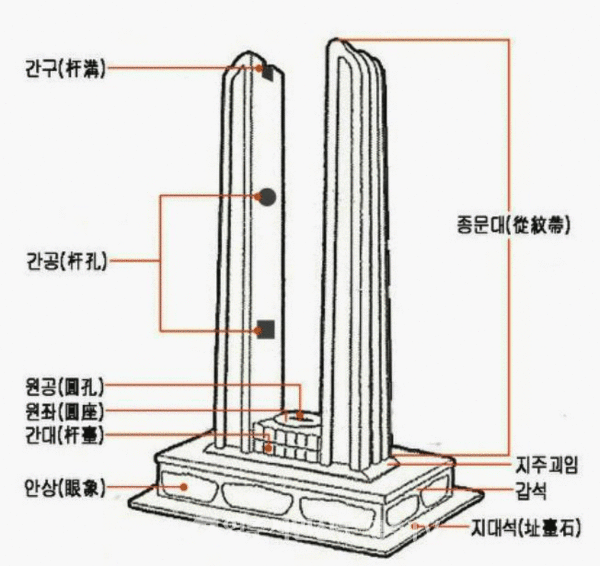
「숙수사지당간지주(宿水寺址幢竿支柱)」는 소수서원 출입문으로 들어가기 전 오른편 죽계천변에서 수증기를 등에 업은 체 중심을 잡고 서 있다. 서원에 무슨 당간지주?
이곳 소수서원은 통일신라시대의 숙수사(宿水寺)라는 절터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 당간지주는 숙수사의 흔적으로 보면 된다. 사찰 폐사 후 명당터를 점찍어 두었던 유림에 의해 잽싸게 서원이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숙수사지당간지주」가 손을 흔들어준다. 숙수사의 옛 영광을 기억해달라는 뜻일 것이다. 천년을 달려온 당간지주는 다시 천년이 흐른다 해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킬 작정이다. 묵묵히 서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당간지주는 할 말이 많다. 수백 년 호시절을 지내오기도 했지만, 정축지변 이르러서는 이 고장 유림의 수많은 시신 수몰 광경까지 지켜봐야 했던 당간지주이었기에….
숙수사라는 이름은 「숙세선연 조계산수(宿世善緣 曹溪山水)」 즉 ‘좋은 인연으로 가르침을 쌓는다’는 불교 용어에서 맨 앞글자와 맨 뒷글자를 발췌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소백산 자락을 정신없이 타고 내린 계류가 처음으로 평탄한 지형을 만났으니 물이 절로 잠들 수밖에 없어 ‘숙수사(宿水寺)’라 했다고 우스개처럼 말하기도 한다.
이러던 숙수사가 언제 법통이 끊어지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이곳 백운동에 서원이 없었던 시절 고려 말기의 학자 안향(安珦)이 이곳 숙수사에서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그의 아들과 손자까지 이곳에서 수학했다고 하니 조선 초기까지는 실존했던 사찰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중국이나 일본에는 이런 당간지주가 별로 없다고 한다. 유독 우리나라에 당간지주가 많이 남은 것은 고대 마한(馬韓) 시대 소도(蘇塗)의 전통이 불교와 겹쳐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하여간 소수서원 입구를 지켜 선 「숙수사지당간지주」는 지금의 위치가 원래의 위치로 보여진다. 숙수사의 원주인이자 천년을 훌쩍 넘은 중후한 연륜의 「숙수사지당간지주」를 소수서원 관광객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당간지주는 매일매일 손을 쳐들어 흔들고 있다.
